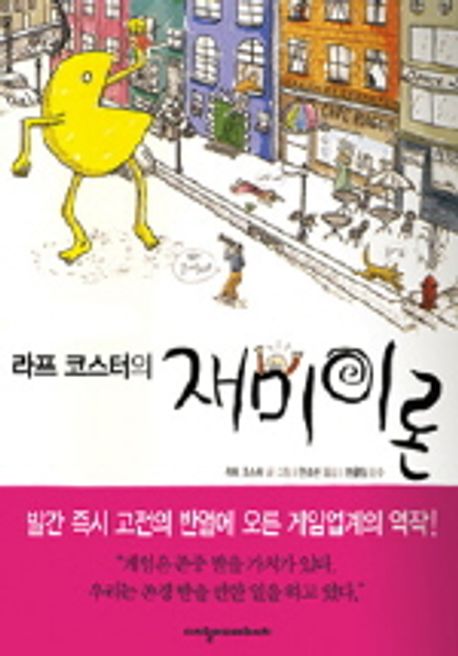세계로 가는 여성부 - BBC와 CNN 해외토픽에 대한 트랙백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캠페인 한 번 잘 못 했다가 완전히 여론의 방망이를 흠씬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대부분의 블로그와 답글들도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밖에 없군요. 아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감정적인, 그리고 단순한 이 이벤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단, 평소에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가 못마땅하니 이 기회에 없애버리자는 투의 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밉고, 무슨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다 대통령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참 아쉽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정부 기관의 하나로 생긴 것은 국가 인권 위원회의 탄생과 함께 우리 나라의 민주화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한 유사한 국가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일이지요. 여성가족부와 인권위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 단체에서 하기 힘든 인권 신장 노력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손들어줄 수 밖에 없는 한계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위는 아직도 의결을 하지 못하고 권고만 할 수 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비판과 내외부의 때로는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 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통제를 본업으로 하는 정부라는 거대한 기관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서가 생겼지요. 이것을 보고 조선일보와 같은 황색 신문에서는 정부 기관들이 의견 조율 못하고 딴소리한다고 비판하겠지만요.
이번 캠페인은 여성가족부도 시인했듯이 방법적으로는 호되게 비판받을 구석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보도 블럭을 다시 까는 것이 차라리 낫다느니,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아직도 100만명 이상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사람의 몸과 성을 사는 행위를 하룻밤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심각한 예를 들지 않아도 문제는 많습니다.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성차별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왜 회사에 여성 임원, 아니 임원까지 가지 않아도 여성 부장님은 가뭄에 콩나듯이 발견되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의사는 대부분 남자이고 간호사는 대부분 여자일까요? 왜 미팅을 하면 남자가 주로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왜 주부하면 여성만 떠올리게 되고, 남자가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될까요? 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자들은 밤길을 조심해야 할까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아직은 매우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여성가족부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주 심각하고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런 목적 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번과 같이 많은 남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캠페인을 만들었겠지요. 사실 궁금합니다. 왜 성매매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감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지 않는지. 해외 언론에 이런 소식이 소개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태국에 성매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로 한국 남성들이 태국에 성매매를 하려고 관광을 한다는 이야기), 네덜란드에는 아예 합법화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태국 남성들과 네덜란드의 남성들을 이상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단 내의 모든 사람을 싸잡아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틀린 이야기이고 개인은 다 다르니까요. 자신이 속한 나라에서 성매매가 횡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말하는 남성들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과 그 나라가 부럽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속한 집단, 특히 나라, 민족, 가족처럼 핏줄과 연관되어 쉽게 바꾸기 힘든 것들을 스스로 비판하기는 여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성매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알려진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아직도 돈으로 사는 성폭력인 성매매가 널리 횡행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부끄러운 일입니다.